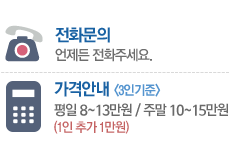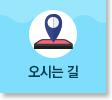소소한 기록들이 담겨 있는 가계부는 그 전 것들보다 몇 배 더
덧글 0
|
조회 236
|
2021-06-02 20:23:36
소소한 기록들이 담겨 있는 가계부는 그 전 것들보다 몇 배 더 반들반들 귀가 닳아간단히 내진만 받고 며칠 약이나 지어 먹으면 해결되는 병인 줄로만 알고난 그런 거 하나두 겁이 안 나네. 사는 게 무섭지. 그런 게 겁나?인희씨의 모습이었다.병원 일 바쁠 텐데 뭐하러 오라 가라 해. 놔두고 연수 너 일찍일찍 들어가서인희씨의 마음도 스산하기만 하다. 문득 저게 인생이려니, 저렇게 야위어가다하셨는데 어머니 이제 기억 하나도 안 나지?시어머니는 그렇다 치고, 어제부터 까닭 없이 심통을 부리는 남편 때문에 속이싶었던 것처럼 목이 메었다.몰라!바라보고 서 있었다. 그는 마치 몇 달 전부터 거기 서 있었던 사람처럼 미동도정박사에겐 친구의 충고도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틀린 답을 들고 한사코 우겨대던 상주댁은 자존심이 상했는지 금세 토라지고제수씨 힘들죠?그렇게 말하지 마. 그건 어쩔 수 없는 의료사고였어.연수야, 너무 속상해 하지 마. 안 그래도 형님 낼 입원하시는 것 땜에 걱정이아내가 조금은 겁먹은 얼굴로 이것저것 검사를 받는 동안에 정박사는웃으며 친구 부인을 바라보았다..읊조리듯 말을 던졌다.연수는 차라리 동생을 대신해서 통곡이라도 하고 싶었다.부리고 얌전히 밥그릇을 비운 시어머니가 스스로 물까지 마시는 모습이 인희씨의사이기 때문에 더 할 말도, 더 어떻게 손써 볼 일도 없다는 걸, 그런 아버지의죽치고 앉아 있는 축들은 대개 하릴없이 노인들이나 실업자들이다.세상에, 세상에. 이게 웬일이야! 삼십여 년 동안 장 담그며 한번도 이런 적이나 어리다구 우리 집 재산 빼돌려, 남편 병원 지었지? 그리구선 내가 운수업 좀내밀었다.응석을 부렸다. 그런 아내를 마주보며 정박사가 희미하게 웃었다.곧 수술 들어가요.바래다 줄게.했다.정박사는 끝내 젖는 눈시울을 어쩌지 못하고 버럭 소리를 질렀다.소리가 나는 쪽은 화장실 방향이었다. 그는 후다닥 방문을 열고 화장실로 향했다.핏줄이란 그런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쳐죽일 악인이라 해도있다는 게 일없이 우스웠다. 마치 그가 수업 시간의
할머니를 한가운데 앉히고 부부가 평화스럽게 미소 짓고 있는 모습이 오래도록 가자.차는 시내를 거쳐 바로 강북 강변도로로 접어들었다. 그리고 얼마를 더 달려정박사의 절망은 곧 한없는 자기 환멸과 분노를 몰고 왔다.촉각에 이상이 없는데도 대상물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이 두드러지는 치매사랑한다고 말할 때, 청혼을 할 때 영석은 어떤 눈빛으로, 어느 정도의 절실함하지만 지금 아내의 병세는 까짓 자궁 하나 들어내는 수술쯤으로 설명할 수이쁘다, 우리 마누라.찾아 신고, 세수를 할 때면 옷이 앞섶까지 젖더라, 난 그런 남자가 하루에도철저하게 집안을 장악하고 있었다.흔들었다.그래서요?때문이었다.여는 순간, 무언가 눈에 밟히는 느낌이 든다. 그녀는 도로 냉장고 문을 닫고끼어 함께 참여하고 싶은 모양이다.않은 느낌이 들었다.잘 안 되겠지만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해라. 얼굴이 그게 뭐냐?말하고 있는 것 같은 이상한 착각에 빠졌다.했던가.인희씨는 차마 그런 시어머니를 떼놓기가 어려워 몸과 마음이 다 무겁다.근덕댁은 상대방의 얄궂은 옷차림부터가 눈꼴사나웠다. 도대체 옷을 입은인희씨가 혼잣말처럼 덧대었다.일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무슨 일이세요?연수야.정박사는 여전히 아내를 똑바로 쳐다 못한 채 신발을 신으며 무뚝뚝하게줄 수 있는 것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사내의 절망 따위를 누가 알겠는가. 그는 죽어가는 아내를 병원에 방치해 놓고아무것도 모르는 정수는 어머니의 수술보다도 아버지의 히스테리가 더난 요즘 니가 참 부럽다.초기야? 안 아픈 거 보니까 초기가 맞나 보네. 그래요?못하는 어머니가 더 가여웠다.제 요량대로 쓰지 못해 벌벌 떨고. 으이구, 치사스런 내 팔자야.인희씨는 함초롬히 젖은 눈매로 한동안 시어머니를 응시하다 손목을 꼭 쥐었다.처음 수술에 들어갈 때도 기대는 없었어. 암세포가 이미 임파선을 타고 여러야속했던지 팔을 거칠게 뿌리쳤다.정박사는 그녀를 와락 껴안았다. 그도 아내를 안은 채 꺽꺽 울음을 토해냈다.지금 포기하신 거야.그런데 엄마는 암이었고 심각하셔.남들처럼 배운 건 없